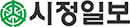최근 세계 대도시는 보행활력이 도시커뮤니티의 거주성을 높이는데 주목해 가로의 장소성을 확보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뉴욕의 5th 에비뉴, 베를린의 운터 덴 린든, 발로셀로나의 람블라스는 보행활력이 넘치는 세계적인 가로다. 이들 도시들은 가로의 아이텐티티와 장소성을 형성하고 보행을 활성화하기 위해 가로뿐만 아니라 가로와 접하는 건물전면공간에도 다양한 디자인 개념을 적용해왔다. 하지만 건물전면공간은 사유지이기 때문에 가로와 통합되도록 디자인을 유도하는 것에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한계로 인해 그동안 서울시의 보행환경정책은 건물전면공간에 대한 디자인 개념이 없이 보행자를 끌어들이지 못하는 무개성적인 가로환경을 양산해왔다.
그동안 서울시의 보행정책은 보행자가 밀집하는 가로가 아니라 사업하기 쉬운 구간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경향이 있다. 또 보도의 공간구조적 개선보다 보도포장과 간판정비 등 간편하게 바꿀 수 있는 것에 사업을 집중해왔다. 한편으로 건물전면공간에 산재하는 단차, 경사, 화단, 벽체, 지하진출입구 등 보행저해시설은 가로의 보행유효폭은 상당히 축소하고 있다. 또 업무가로, 상업가로, 생활가로, 특화가로 등은 가로의 특성과 무관한 천편일률적인 건물전면공간으로 보행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보행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향후 서울의 보행환경정책은 건물전면공간의 형태와 기능 선진화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우선 건물전면공간을 가로의 장소만들기 설계수단으로 활용하고 커뮤니티의 아이덴티티와 장소성을 창출할 수 있도록 디자인개념을 도입한다. 이를 위해 건물전면공간의 형태와 기능을 다양화하는 디자인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보행활성화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공적공간 관리대상에서 건물전면공간의 디테일을 포함시켜 전물전면공간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보도포장·간판정비 등 ‘형식적’ 노력
말뿐인 특화가로 ‘심심한’ 거리 전락
Ⅰ. 보행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서울의 가로환경
1997년 시작된 걷고 싶은 거리부터 2010년 디자인서울거리까지 서울의 보행정책으로 가로환경이 개선된 가로는 보행자가 밀집하는 가로와 불일치했다. 보행자가 밀집하는 중심지 간선가로변은 대부분 민간소유 부지로 가로환경개선에 기여하는 건축개발 유도에 한계를 드러냈다.
서울시는 보도포장·복구와 간판정비에 45%, 특화거리 및 탐방로 조성에 31%, 보도확장에 3% 등 가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의 절반 이상을 보도포장·복구와 간판정비에 편성했다.
디자인서울거리사업 역시 가로시설물 개선과 가로 조형물 설치 등 가로의 의미지를 쉽게 바꿀 수 있는 내용에 치중했다.
건물후퇴폭을 포함한 전체 보도폭은 서울이 뉴욕, 보스턴, 런던, 도쿄에 뒤지지 않으나 보행을 저해하는 단차, 경사, 화단, 벤치, 벽체 등 다양한 보행저해시설로 보행환경이 매우 열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양한 외부활동이 일어날 수 있는 편안한 외부공간 부재로 보행을 활성화하는 보행공간의 물리적 구조도 열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물전면공간의 형태와 기능은 건축법에 따라 토지 소유자의 권한에 의해 결정, 건물전면공간이 다양한 보행활동의 활성화라는 공공적 가치를 구현하는 준공공공간으로 기능하는데 제약받았다. 또 가로에 면한 건물전면공간 설계는 들쑥날쑥해 보행활력을 담아내는 가로벽 형성과 저층부 용도의 밀집과 무관했다.
서울의 업무가로, 상업가로, 생활가로, 특화가로 어디를 가나 보편적이고 비슷비슷한 전물전면공간이 가로의 얼굴을 형성하고 있어 가로의 장소성 형성에 기여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서울의 최대 보행고밀가로인 강남대로 보도폭은 뉴욕의 타임스퀘어 보도폭 보다 2m 넓지만 보도공간의 확장인 가로일체형이 대부분이라 실제 보행유도폭은 좁고 보행흥미를 유발하는 요소는 부족했다. 뉴욕, 런던, 도쿄의 주요 가로의 건물전면공간의 경우 광장형이 우세해 공간과 외부활동의 질적 차이가 존재했다.
가로를 양질의 공공공간으로 조성하는데 중요한 요소는 가로수나 스트리트퍼니처가 아니라 가로에 면한 건물전면공간의 형태와 기능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로의 얼굴인 건물전면공간을 유도하고 규제하는 제도는 17가지로 일반법에서 심의기준까지 다양하나 통합돼 작동하는 시스템이 부재, 건축성 지정과 공개공지만으로는 양질의 건물전면공간 형성과 보행환경을 개선하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실질적인 보행환경 개선과 보행활성화 기여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 도입이 필요하다.
건축선 후퇴·공개공지 보행공간 확보
도시소통의 아이덴티티·장소성 형성
Ⅱ. 서울의 보행공간 활성화 전략
서울시는 건축선 후퇴와 공개공지가 보행공보 확보라는 양적 목적에서 보행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도록 운영방안을 전환, 가로와 건물전면공간을 하나의 패키지로 통합해 계획·설계·정비·관리하는 선진화된 보행환경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
주요 추진전략으로 △건물전면공간의 아이덴티티와 장소성 부여 △건물전면공간 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건물전면공간 관리방안 선진화 등이다.
서울시는 ‘건물전면공간의 아이덴티티와 장소성을 부여’하기 위해 사유지의 일부로 인식돼 온 건물전면공간을 가로의 일부이자 얼굴로 인식하고 도시커뮤니티의 아이덴티티와 가로의 장소성을 형성하도록 유도했다. 건물전면공간을 보행동선을 집중·분산시키며 부지와 가로를 통합하는 장소만들기의 설계언어로 활용했다.
또 보행자에게 매력있고 개방적인 건물전면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주요 상업가로의 보행을 활성화하고 슬럼화된 커뮤니티를 재생했다.
뉴욕시의 경우 슬럼화된 커뮤니티의 가로변에 건물주가 운영하는 스트릿 카페조성을 지원해 도시커뮤니티의 아이덴티티를 확립했다.
서울시는 ‘건물전면공간의 디자인가이드라인 수립’을 위해 건물전면공간이 가로경관에서 상징적인 랜드마크이자 기능적인 보행활동거점이 되도록 형태와 기능을 유형화해 운영, 가로의 기능적 특성에 따라 상업가로는 가로와 건물저층부가 밀착되도록 건축후퇴선을 억제하고 벽면지정선을 활용했다. 또 업무·생활가로·특화가로에 대해서는 가로의 특성과 연계해 후퇴부의 규모·형태·기능을 상세하고 다양하게 유도하도록 지침과 기준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건축법과 서울시 건축조례에 의한 건축부지규모에 기준하는 공개공지 면적산정<소공원(일명 쌈지공원) 용적율 1.2배 이하, 필터형·선큰형 0.6이하 인센티브 부여>은 다양한 외부활동을 수용할 수 있도록 건물전면공간의 형태와 기능에 대한 기초연구와 심층적 선진사례 연구를 통해 융통성 있게 적용했다.
서울시는 ‘건물전면공간 관리방안 선진화’를 위해 보행활성화에 기여하는 공간의 규모와 위치, 인접건물 저층부의 식음휴게용도 입지, 가로벽 형성 등으로 가로환경의 질적 향상에 기여한 경우에 한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일반적으로 건물전면공간의 설계와 인센티브를 규정하는데 한계를 보임에 따라 최근 세계도시는 기본계획, 특별규제, 디자인가이드라인, 심의기준으로 건물전면공간의 설계와 인센티브를 운영하고 있다.
또 공적공간 관리대장시스템을 보완해 건물전면공간을 통합관리했다.
2009년 도입된 공적공간 관리대상에서는 사유지 내 조성된 공개공지에 대해 개략적인 위치 등의 정보를 배치도에 표시해 관리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건물전면공간으로 대상을 확대해 위치, 규모, 조성현황을 세밀하게 기록·관리하고 건축심의·인허가 도면이 건물의 특성을 설명하는 수준만큼 건물전면공간의 디테일을 설명하도록 의무화하고 통합관리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여혜진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
한광야 / 동국대학교 건축학과 부교수
건물 앞 커뮤니티의 ‘장소’가 되다
뉴욕의 보행환경정책
뉴욕은 건물 주변의 다양한 외부공간이 가로와 통합돼 보행을 활성화하고 보행흐름을 순환시키는 보행순환공간(pedestrian circulation space)으로 기능, 불필요한 건축선후퇴를 억제해 정연한 가로벽을 형성하고 보행활성화에 기여하는 형태와 기능을 적극 유도하는 등 도시 보행환경과 장소성에 주목해 가로에서 도시커뮤니티의 활력을 느낄 수 있도록 가로를 맥락적으로 조성하는 제도를 발전시켰다.
5th 에비뉴를 따라 조성된 공공·민간건물은 보행활동의 거점으로 보행동선을 연결할 뿐만 아니라 보행동서를 동-서로 확장해 보행활력을 증진시켰다. 또 록펠러 센터(Rockefeller Center), 뉴욕공공도서관(New York Public Library)과 같은 공공건물 또는 공공성을 지닌 민간건물이 역 주변 등 보행자가 밀집하는 공간을 연계하는 건물전면공간을 형성했다.
1961년 인센티브 조닝과 특별구역지정제도로 뉴욕 전체에 맥락구역(contextual district)을 설정, 기존 가로경관을 유지하도록 가로 맥락을 기준으로 건물의 높이와 건축후퇴선의 폭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또 플라자, 아케이드, 공개공지, 보행자공간, 비수익시설의 제공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형태와 기능에 대해 인센티브를 차등적으로 부여해 약 40년간 뉴욕 맨해튼 320개 건물에 503개 준공공적 건물전면공간을 조성했다.
뉴욕은 2007년 503개 건물전면공간에 대한 이용실태 조사 후 ‘뉴욕시 조닝 법규’에 공공성이 강화된 인센티브 차등 부여방안을 도입, 기존의 13개 건물전면공간 유형을 9개로 축소하고 건물전면공간을 보행순환공간으로 정의해 형태와 기능의 원칙을 재정립했다. 또 약 185㎡ 규모의 퍼블릭 플라자를 다양한 보행활동을 수용하는 최소 크기로 규정하고 인센티브를 제공, 보행순환공간의 모든 유형에 대해서도 디자인 스탠더스(37-53, Design Standards for Pedestrian Circulation Space)를 제시하고 유형별 크기·형태·구조·배치·시설 디자인을 상세하게 규제했다.
5th 에비뉴는 건축물의 의장, 용도, 건물전면공간의 연속성과 가로벽 등의 요소를 통해 보행활성화에 기여했다. 상업시설의 연속배치를 위해 1~2층의 전면부에는 상업용도를 반드시 수용하도록 하고, 전면공간이 사무실 입구로 단절되지 않도록 규제했다.
지상층 보행 활성화를 위해 5th 에비뉴 상에 큰 선큰 플라자 조성을 금지하고 밀도 있는 가로 전면공간을 형성하기 위해 5th 에비뉴에 면한 건물은 건축선에서 3m을 초과한 건축선후퇴를 불허했다.
뉴욕시는 조닝, 특별조닝구역, 상업구역특별도시설계규제, 부구역특별조닝규제로 지역의 아이텐티티가 가로에 구현되도록 제도를 운영했다.
5th 에비뉴 건물전면공간은 상업구역 특별도시설계규제, 미드타운 조닝규제, 5th 에비뉴 특별조닝규제의 3개 제도를 중첩활용해 가로의 형태와 기능을 관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