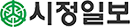임춘식 논설위원

[시정일보] 한국 사회도 2024년 말 100세 이상 인구가 8,900명을 넘어, 65세 이상 노인 인구 1,000만 명 시대에 돌입했다. 올해가 사실상 초고령사회 원년인 셈이다. 준비하지 못한 채 이미 닥쳐온 미래로, 사회적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유엔(UN)이 2025년 세계 인구통계를 분석한 결과, 세계에서 인구 대비 100세 이상 장수 인구가 가장 많은 국가는 유럽의 소국 모나코로 인구 10만 명당 950명이 100세 이상자로 인구 대비로 환산했을 때 세계 최고 수준이다.
다음으로는 △홍콩(10만 명당 124명) △프랑스령 과들루프(100명) △일본(98명) △우루과이(85명) △푸에르토리코(82명) 등이 뒤를 이었다. 영국은 26명으로 32위, 미국은 20명으로 46위를 기록했고 한국은 19명으로 50위를 차지했다.
풍요로운 생활환경과 수준 높은 의료 인프라, 온화한 지중해성 기후 등이 장수 요인으로 꼽힌다. 부자 나라가 오래 산다. 반면 아프리카와 오세아니아 일부 국가 등 27개국에서는 100세 이상 인구가 아예 한 명도 없다.
장수 인구 증가의 배경으로 △의료기술 발달 △근로환경 개선 △흡연율 감소 △건강한 노년 생활 등을 꼽는다. 그리고 100세를 넘긴 사람들은 주요 질병을 피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이들은 다른 사람보다 노령화가 느리게 진행되고, 일부는 질병을 전혀 겪지 않는다.
전 세계 100세 이상 인구는 약 60만 명으로 추정되며, 현재 생존한 세계 최고령자는 1909년생 영국 여성 에셀 카터 햄(115세)이며, 역대 최고령자는 프랑스의 잔 루이즈 갈망(1875-1997)으로 122세 164일을 살았다.
이미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100세의 삶이 어떤 것인지 주변에서 접할 기회가 많아서 장수가 축복이 아니라는 걸 직간접적으로 경험한다. 그러나 무전·무위·무연의 삶을 사실적으로 지켜봤던 100세 삶을 마냥 기대하긴 어렵다. 장수 리스크라는 말이 많이 회자하고 있지만, 이를 실감하는 사람은 많아 보이지 않는다.
어쨌든, 장수 시대이다. 100세 시대라는 말이 공공연하고 자연스럽게 언급된다. 모든 삶의 계획도 100세에 맞추어서 설계해야 한다는 시대이다. 100세를 사는 것이 축복일까? 100세가 되면 주변 친구들이 세상을 떠나 마음을 나눌 대상이 없다. 가족의 보살핌을 받아야 해서 가족에게 짐을 지워야 한다. 몸은 힘겹게 하루하루를 버텨야 한다. 이런 삶에 행복이 있을까?
성경에는 수명이 120세로 나온다(창세기 6장 3절). 현대 의학자들도 비슷하게 125세까지로 보고 있다. 통계청에서도 현재 65세를 넘은 사람의 평균 수명이 91세라고 발표한 것을 보면 인생 칠십은 옛말이고, 인생 백세 시대가 온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건배사 중에 '9988 123'이라는 것이 있다.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하루 이틀 아픈 후, 3일 만에 죽으면 참으로 행복하다'라는 의미다. 이제 건배사도 업그레이드가 되어 '9988 121'로 바뀌었다. '99세까지 팔팔하게 살고 하루 이틀 아픈 후, 다시 하루 만에 건강이 회복되어 새로운 100세를 준비해야 한다'라는 말이다. 우스갯소리 같지만, 이 모두 다가오는 100세 시대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은 인간의 욕망을 표현한 내용이 아닐까 한다.
나는 몇 살까지 살 수 있을까? 요즘 기대수명을 알아보는 앱이 있길래 궁금증이 생겨 작성해 보았다. 나의 가족력과 여러 가지 건강 상태에 대한 질문에 솔직하게 답변하면 기대수명이 계산되어 나온다. 나의 기대수명은 118세로 나왔다. 일단 기분은 좋았다.
그런데 "그렇게 오래 산다고요?" 부인이 냉큼 반문한다. "아니 내가 오래 사는 게 싫어?", "그게 아니라 오래 살면 뭐 해~~“ 부인이 말끝을 얼버무렸지만 나는 '진실의 순간'을 보고 말았다.
문득 이런저런 생각이 떠올랐다. 과연 118세까지 오래 사는 것이 좋은 일일까? 아내마저 놀라는데 아들딸에게 이야기하면 어떤 반응이 나올까? 결국 아들딸에게는 이야기하지 않기로 했다.
사람은 오래 살게 되면 결국 남에게 돌봄을 받게 되고, 이에 대한 심리적 저항감이 있다. 100세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아파서 병원에 가야 할 때도 보호자가 없어 고생하는 홀로 사는 노인도 많은데, 이들을 사회가 어떻게 지원해야 할지가 큰 과제로 남는다.
시간은 우리 편에 있지 않고, 우리의 눈앞에서 계속해서 고갈되어 가는 것처럼 보인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장수를 추구하는 이유이다. 우리는 기술이나 의학적 진보, 또는 영성을 통해서, 혹은 단순히 거짓말을 통해서 이것을 추구하지만, 그런데도 장수하는 것은 여전히 어렵다. 100세 이상을 사는 것은 소수의 운 좋은 사람들의 이야기이다.
일반인들이 장수를 두려워하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간병치레 때문이라며 본인 병치레만큼 힘든 게 배우자 병치레여서 배우자보다 하루라도 먼저 죽길 바라는 것일 수도 있다. 자기 자신의 죽음보다 ‘나 홀로 노년’이 되는 걸 두려워한다. 아파서 병원에 가야 할 때도 보호자가 없어 고생하는 독거노인이 많은데, 이들을 사회가 어떻게 지원해야 할지가 큰 문제로다.
"너는 늙어봤냐. 나는 젊어 봤다" 한때 유행했던 말이다. '마음이 청춘이면 몸도 청춘이 된다.'이 나이에 무엇을 하랴라는 소극적인 생각은 절대 금물이다. 노령에도 뇌세포는 증식한다. ‘죽을 때까지 공부하라' 확실히 '늙음'은 나이보다도 마음의 문제인 것 같다.
물론 생사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일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때까지 살 수 있다면 감사한 인생이 되지 않겠는가? 항상 젊은 마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새로운 일에 도전하면서 바쁘게 사는 것이 젊음과 장수의 비결인 것 같다. 인간은 움직이지 않으면 쉽게 노화된다. 인간의 수명이 얼마나 되는가? 하는 논리는 예로부터 있었다.
결국, 늙어 가는 사람만큼 인생을 사랑하는 사람은 없다. 젊음은 자연이 준 선물이고, 아름다운 노년은 스스로 만든 예술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이다. 죽음이 언제 어디서 내 이름을 부를지라도 ‘네!’ 하고 선뜻 일어설 준비만은 되어 있어야 한다.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두려워하기보다는 남은 삶을 어떻게 보내야 아름답게 살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한다. (한남대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