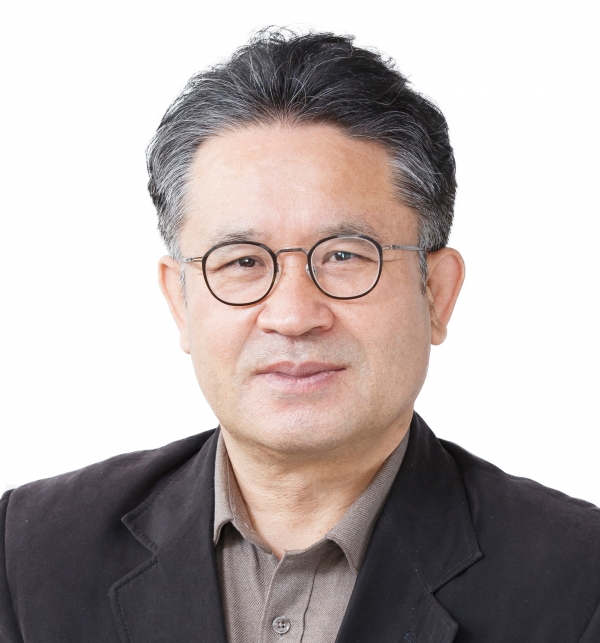
[시정일보] 최근에 어떤 분이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국회의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동감이다. 한국의 국회의원은 OECD 국가 중 일본, 이탈리아에 이어 3번째로 높은 연봉을 받고 있다. 수당(월급)과 상여금, 활동경비를 포함해 1억 5천만 원 정도 된다. 본회의, 상임위 등의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옥에 구금되어 있어도 수당은 지급된다.
국회의원 월급에 대한 논란은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 국회의원 급여를 낮추면 안 된다는 주장도 있었다. 국회의원이 장·차관급 이상의 월급을 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논리가 ‘궁핍한 권력은 부패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국회의원이 돈이 궁할수록 자신의 권력을 악용해 이권과 결탁하거나 불법 후원금 모집에 혈안이 될 것이라는 말이다.
이런 주장은 얼마간은 꽤 호소력이 있었다. 과거 재벌가 출신의 한 국회의원은 선거 과정에서 “나는 돈이 많아서 부정한 돈과 이권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자유롭다.”고 주장하기도 했으니까. 하지만 이런 주장은 어디까지나 권력을 가진 선출직 공직자는 어쩔 수 없이 부패할 것이라는 전제를 담고 있다. 후진적이고 퇴행적이다. 한국의 경우 국회의원 스스로가 세비를 결정하고, 그 공개 방식과 범위 또한 자신들이 결정한다.
프랑스는 공무원 임금의 상승률에 연동해서 국회의원의 월급을 결정하고, 미국은 물가와 생활임금의 상승폭에 연동한다. 한국은 예외다.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등의 북유럽 정치선진국에서도 국회의원의 월급은 일반 국민 평균 소득의 2배에 달한다. 하지만 그들은 권력에 걸맞은 공개의 원칙을 가지고 있다. 기차표 하나, 유류비 영수증 하나마다 모두 내역을 명시해서 대중에게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한국과 같은 수천만 원의 식대를 일식집에서 공금으로 지출하고도 아무런 일도 생기지 않는 정치문화와는 거리가 멀다.
심지어 스웨덴의 자유당 소속 총리 후보였던 지방의원 출신의 라르스 니칸데르다(Nicander)는 2019년 시에서 발급한 신용카드를 사용해 개인 용도로 초콜릿을 구입한 것이 폭로되었다. 그가 사비로 관련 지출을 다시 메웠고, 관련 제한 규정이 생기기 전에 관행적으로 용인되었던 일이었지만, 그는 공직자가 가져야 할 지출의 엄정함을 어겼다는 시민들의 비난으로 결국 사임해야 했다.
만약 국회의원의 급여가 상여금을 포함해 근로자 평균임금 수준인 290만 원 내지는 최저임금 200만 원 정도라면 어떨까. 더 나아가 완전한 무보수 봉사직이어도 국회의원을 하겠다고 수억 원의 선거자금을 써 가며 출마하려 할까. 이 경우 의정 활동을 위해선 자기 돈을 써야 할 것이다.
원래 4년제 비정규 봉사직인 국회의원직은 지금은 직업화되어 전문 정당 정치인의 고착된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국회의원의 월급을 파격적으로 낮추고 후원금과 수당 등의 내역을 실시간 공개·검증하는 시스템을 도입한다면 참신하고 능력 있고 양심적인 정치인이 대거 등장할 것이고, 국회의원들이 가진 특권 또한 상당 부분 내려놓으라는 사회적 압력을 받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 그들이 저임금 노동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비슷한 처지의 시민의 삶에 깊이 공감하고 개선을 위해 노력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무담임도 두 가지가 있다. 위정자들처럼 국민의 손에 의거 선출되는 선출직이 있고, 공개채용이든 서류심사든 채용에 의거 임명되는 직업공무원이 있다. 소위 경력직 공무원은 직업이다.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가 명확하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직업이 아니다. 나랏일의 종사자로서 법과 규정에 얽매이며 이중삼중의 감시 장치를 통해 딴눈을 팔 수 없는 자리다. 국회의원부터 최소한의 품위유지비만 받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자리매김한다면 국민들의 시선 또한 호의적으로 바뀔 것이다.
특히 국회의원은 기초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생사여탈권에서 빨리 손을 떼야 한다. 정당공천 배제가 핵심이다. 정당 공천을 받아야 당선권에서 경합할 수 있는 현행 구조에선 후보자들이 유권자인 주민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정당에 예속되어 우선 공천권자의 눈치만을 보게 된다. 그리고 공천권자들은 후보자의 능력이 아니라 자기 사람인지를 먼저 확인하기 마련이다. 그래서 우린 해마다 함량 미달 정치인의 기행에 경악하고, 그 뻔뻔함에 질리기를 반복하고 있다.
1991년 지방의회,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의 선거에 의해 선출됨으로써 본격적인 지방자치단체가 깃발을 올렸다. 국민들이 바라는 지방자치의 선출직 또한 국회의원과 다름없을 것이다. 그 나물에 그 밥, 내로남불이 아니라 선량한 ‘선량’을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