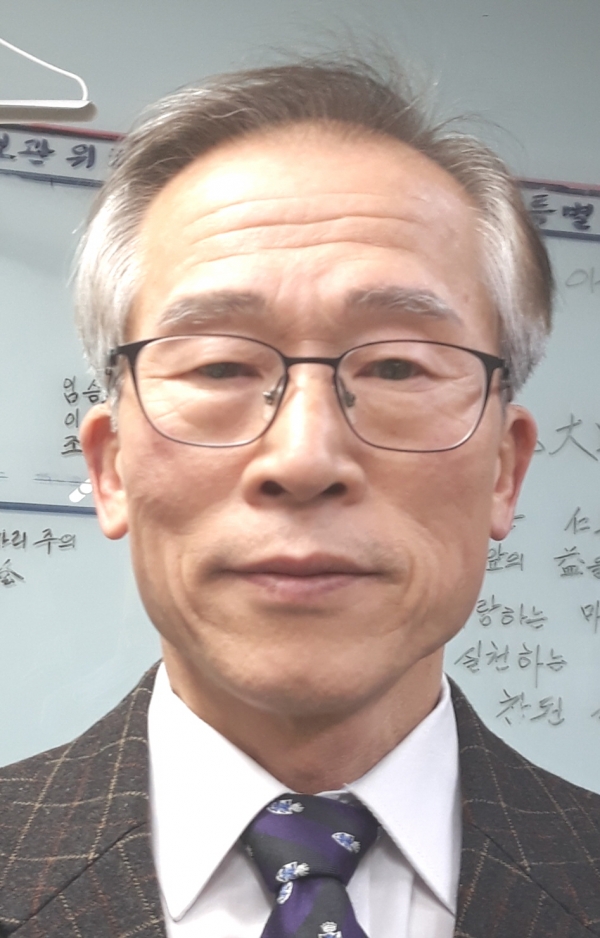
[시정일보] 1944년 가을, 지난해에 이어 이해도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은 가뭄이 이어지자 이로 인한 한해가 극심했다. 저수지의 바닥이 쩍쩍 벌어지는 지경에 이르니 이해는 아예 못자리조차도 할 수 없었고 이렇게 되자 영화 농장 들판의 논에는 초롱 잎과 둑새풀, 갈대 따위의 잡초들만 자라고 있었으며 이 잡초들마저도 여름내 불어오는 열풍에 찌들어 앙상한 모습이 되어 있었던 것이었다.
이러한 가운데에도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지난겨울, 논과 밭에서 수확한 보리가 있었기에 넉넉하지는 않지만, 아사만큼은 면할 수 있었던 것이었으며 그래도 모자라는 곡식을 보충하기 위해 논두렁과 밭둑에서 쑥과 이외 나물들을 뜯어다 쑥밥을 짓고 무밥을 지어 먹기도 했다.
어떤 이는 만주나 이외 지역으로 돈벌이를 위해 떠나는가 하면 고향에 남은 사람들은 그들 나름대로 배를 짠다든가 갯일을 하는 등 생존을 위해서라면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그 어떤 일이라도 감내해 내고 있었으니 이는 기나긴 가뭄을 극복하려는 영화농장 사람들의 애절한 절규와도 같은 것이었다.
아침 이른 시간, 바구니를 옆구리에 낀 순녀는 부엌을 나와 집 귀퉁이 기둥 뒤에 서서 얼굴을 빼꼼히 내밀고 마당의 동태를 훔쳐보고 있었다.
큰방 문이 닫혀 있고 마당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순녀는 도둑걸음으로 마당을 건너 집을 나왔다. 순녀는 영산강으로 맛을 잡으러 가는 길인데 그녀의 아버지, 인길 양반이 알면 큰일인 것이다.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니 인길 양반에게 있어서 영산강은 자라와도 같다. 예전 복룡촌에 살던 시기, 인길양반의 본처가 영산강으로 갯일을 갔다 변을 당했으니 인길 양반에게 있어서 영산강은 자라와 같이 여겨졌던 것이며 식구 중 누구라도 갯바닥의 '갯' 자도 입에 올리지 못하게 했던 것이었다.
이러한 까닭에 순녀는 인길양반 모르게 영산강으로 맛조개를 잡으러 가는 중인 것이다. 순녀가 저수지 둑 아래에 이르자 먼저 온 다른 여인네들이 순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여인네들은 신원목과 도덕지 여인네들로 젊은 부녀자들과 혼기가 임박한 처녀들이다. 그중 순녀의 또래인 양님이가 치근대어 순녀에게 말한다.
"순녀야! 언능 오제 뭣 헌다고 인자사(이제야) 오냐? 오늘 물대가 이른 물댄디."
"아따. 울 아부지 모르게 오니라고 정제(부엌)로 갔다 마당으로 갔다 험서(하면서) 눈치 보니라고 늦어 불었땅께. 미안해. 언능 가세!"
일행들은 제각기 대바구니를 머리에 이고 좁다란 논길을 따라 한 줄로 열 지어 영산강으로 향한다. 긴 댕기머리에다 몸빼 바지가 하늘거리니 봄바람에 수양버들 일렁거리는 듯한 이들 여인들의 행렬은 영화농장 선녀들의 행진인 것이다.
일행 중 누군가 노래를 시작한다. 목청 좋은 양근예였다. 처음 한 사람, 두 사람 따라 하더니 나중에는 다 같이 합창을 한다.
간다 간다 나는 간다 / 님도 보고 맛도 잡고 / 불어오는 강바람에 / 치맛자락 날림 시러 / 쓰는 물에 맛을 잡고 / 드는 물에 기를 잡세 / 맛을 잡아 탕을 끓여 / 울 아부지 탁주 안주 / 기를 잡아 젓을 담어 / 우리 어메 알뜰 반찬 / 영산강에 부는 바람 / 월출산아 너는 알지 / 춘삼월에 꽃바람은 / 처녀총각 바람나고 / 영화농장 훈풍에는 / 보리밭이 춤을 추고 / 남서풍에 황포돛배 / 영산포로 찾아드네 / 간다 간다 나는 간다 / 영산강에 나는 간다 / 강물 따라 흘러가면 / 그 어디에 님 있을꼬 / 불어오는 갯바람에 / 이내 시름 다 보내네.
노래가 끝나자
"저 참에 돈도리 앞 절강(강이 잘린 곳으로 민물과 갯물이 섞이는 곳)에서 잡은 맛이 크던디 오늘도 거그로 가보까?"
누군가가 일행들의 의중을 묻는다.
"피배미 뜰 옆에 절강? 아니여. 그때 다 더퉈(더듬어) 불어서 시방은 없응께 용당 끝으로 가불세!"
이렇게 하여 일행은 용당 끝 언저리 강둑에 이르렀다. 강 안에서는 이미 썰물이 시작되어 갯벌은 저만치 민 살을 드러내고 있었으며 반짝거리는 갯벌 위로는 뿔 모양의 두 눈을 곤두세운 게들이 바쁘게 기어 다니고 갈매기는 끼룩거리며 머리 위를 난다.
처녀들은 둑 앞 보조 석축 위에 바구니를 내려놓고 개옷으로 옷을 갈아입는다. 벗은 옷은 곱게 접어 석축 위에 단정히 놓은 다음, 바람에 날릴세라 돌멩이로 눌러 놓는다.
긴 새끼줄의 한끝에 바구니를 매어 달고 반대편을 끝을 허리에 묶어 새끼줄로 이어진 바구니를 끌고 갯벌로 들어간다. 갯벌의 입자는 어찌나 고운지 밟아도 밟은 느낌을 알 수 없을 만큼 보드라우며 그 층이 두터워 무릎까지 들어간다.
순녀 일행들은 옆으로 나란히 줄을 지어 뻘을 헤집어 가며 앞으로 나간다. 한 손에 쥔 단지에 상반신의 무게를 싣고 한 손으로는 조개 구멍을 쑤셔가며 앞으로 나가는 것이다.
맛조개란 놈은 사람이 다가가면 보호 본능에서일까 오줌을 구멍으로 내 뿜는다. 맛조개를 잡는 사람에게 '나 여기 있다.'라는 신호까지 친절히 해주는 셈인 것이니 잡는 사람에게는 반가운 일이다.
일행들이 이렇게 오줌이 솟구치는 구멍을 쑤셔가며 앞으로 나아가다 보니 뻘바탕의 중간 즈음에 이르고 앞에 개웅이 나타났다. 개웅은 썰물이 만들어 낸 갯벌 가운데 있는 깊은 개울이다.
펀펀한 뻘바탕 위에 물이 쓰면서 그중 낮은 곳으로 수천 년 동안 흐르고 또 흐르다 보니 깊은 개웅이 된 것이며 이 개웅은 너른 뻘바탕에 커다랗게 S자형으로 흐르기를 몇 번 거듭하며 흘러 강의 중심부인 본류에 이르고 본류 가까이에 이른 개웅 깊이는 사람 키의 서너 질에 이르는 것이다.
맛조개를 잡는 처녀들, 이른바 영화농장 선녀들은 물이 허리춤에 차는 개웅을 건넜다. 더 많은 맛조개를 잡기 위해서라면 몇 번의 개웅인들 못 건네랴.
개웅을 건너 뻘밭을 더듬어 가던 순녀가 허리를 펴며
"부담아! 된장 가져왔지? 이리 와! 운지리(망둥이) 한 볼테기 허자!"
하고 옆에서 맛을 잡는 친구 부담이를 부른다. 부담이 순녀 옆으로 다가간다. 순녀는 바로 잡은 망둥이를 미리 준비한 호박잎으로 훑어 닦은 후 배를 갈라 속 것을 끄집어내고 두 동강을 내어 그중 한 토막을 부담에게 준다.
그리고 제각기 허리춤에서 된장과 고추를 꺼내어 망둥어에 바른 후 그것을 입에 넣고 씹어 대는 것이다. 입안 가득 찬 고기 살을 오물오물 씹는 맛, 이 맛은 먹어보지 않고는 뭐라 형언할 수 없는 천하의 절묘한 맛이다.
사각거리는 식감이나 담백함이 그 어떤 생선에서도 맛볼 수 없는 영산강 망둥어만이 가진 절묘한 맛인 것이다. 이어서 맛잡이는 계속되었다. 한창 맛잡이 중에 신동댁이 묻는다. 신동댁은 외지에서 도덕지로 시집을 와 딸을 하나 낳은 젊은 부인이었다.
"순녀 아가씨! 아가씨는 몇 오가리(항아리와 단지 사이 크기의 옹기) 잡었소? 나는 니(네) 오가리 짼디."
"나도 구덕에(사각형 대바구니) 시(세) 오가리 붓고 니 오가리 째요."
맛조개를 잡는 솜씨는 날고 기어도 거기서 거긴가 보다. 그럼에도 신동댁은 자신의 조개잡이 솜씨를 가늠해보고 싶었던 것이었을까. 이렇게 맛조개를 잡아 오가리에 담고 오가리가 차면 구덕에 담기를 반복하는 것이었다.
간다 간다 나는 간다 / 님도 보고 맛도 잡고 / 불어오는 강바람에 / 치맛자락 날림 시러 / 쓰는 물에 맛을 잡고…….
찌든 가난과 고달픈 삶의 애한을 입으로 씹어 뱉으려는 것일까. 맛조개를 잡으며 목청껏 불러대는 영화농장 선녀들의 구성진 노랫가락은 잿빛 뻘밭 위를 미끄러지듯 퍼져 나가고 이에 장단이라도 맞추듯 갈매기들은 끼룩거리며 허공을 난다.
대바구니가 다 차 갈 무렵 '철썩철썩 쏴아~' 영화농장 선녀들이 맛조개를 잡는 뻘밭 앞쪽으로 밀물이 몰려들고 있었다. 맨 앞쪽에 나아가던 양님이 소리 지른다.
"오메! 순녀여! 부담아! 물이 든다."
영화 농장 선녀들은 하나 같이 손길을 멈추고 앞을 쳐다봤다. 밀물은 선녀들을 집어삼킬 듯, 아니 온 뻘밭을 삽시간에라도 집어삼킬 듯이 드센 기세로 밀려온다.
"언능 나가자!"
그러나 발길을 돌린 영화 농장 선녀들은 아연실색을 했다. 아침나절에 이들이 건넜던 개웅은 이미 무서운 속도로 물이 흐르고 있었으며 개웅이 끝나가는 바깥쪽으로도 벌써 물이 하얗게 차오르는 중이었다.
이들이 맛조개를 잡던 곳이 마침 지대가 높았던 탓에 앞뒤로 물이 들도록 이들은 아무도 그것을 몰랐던 것이었다. 개웅을 건너자니 거센 물살에 휩쓸릴 지경이요, 옆으로 돌아 나가자니 이미 그곳도 물이 차기 시작했을뿐더러 그쪽으로 돌아갈 즈음이면 이미 때가 늦게 될 지경인 것이다.
사면으로 무서운 파도와 함께 밀려드는 물, 어찌해야 할까. 영화농장 선녀들은 모두가 겁에 질렸다. 그러던 중 덩치가 큰 양님이 바구니와 연결된 허리춤의 새끼줄을 풀더니 비워진 단지를 물에 띄워 그것을 잡고 개웅의 급류 속으로 뛰어들었다.
그리고 물살에 밀리며 개헤엄으로 간신히 건너편에 도달하였다. 이 모습을 본 신동댁도 허리춤의 새끼줄을 푼다. 양님이처럼 개웅을 건널 요량인 것이며 새끼줄을 푸는 신동댁의 손은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다. 겁에 질려 제정신이 아닌 것이다.
"신동떡(댁)! 신동떡! 가지 말어라우! 가지 마이쑈!"
남겨진 영화농장 선녀들은 이구동성으로 만류하였으나 겁에 질린 신동댁에게 그 소리가 들릴 리 없었던 것일까 끝내 급류 속으로 뛰어들고 말았다.
"신동떡! 신동떡!"
이리하여 신동댁은 회도리 치는 급류에 휩쓸려 두세 차례 수면 위로 떠 오른 후 영영 자취를 감추고 만 것이었으니 젊디젊은 아낙, 신동댁은 이렇게 개웅에 빠져 죽었다. 이를 본 영화농장 선녀들은 더욱이 겁에 질리고 물살은 점점 거세졌다.
"쩌쪽으로 가자! 감서 소리를 질러!"
갯벌의 높은 부분, 갯등을 타고 개웅을 돌아 최대한 빨리 빠져나갈 요량인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나아가며 물이 허벅지에 이르게 되자 다시 발길을 돌려 애초의 높은 지대로 물러선다.
"정님아! 부담아! 인자 큰소리로 외칠 수밖에 없다. 요이 땅 해서 소리치자!"
"사람 살려! 사람 살려~어!"
그러나 이들이 외쳐대는 절규는 점점 커지는 파도 소리에 묻혀버릴 뿐, 애꿎게도 갈매기만 이리저리 끼룩거리며 날아다닌다. 개웅 건너편에서는 이미 개웅을 건너간 양님이 안타까운 모습으로 발을 구르고 있었으며 그도 이제 차오르는 물 때문에 둑을 향해 나가기 바쁜 지경에 이르렀다.
"사람 살려! 사람 살려~어!"
이제 영화농장 선녀들이 서 있는 곳에도 물이 차오르기 시작하여 그나마 조금 남았던 갯벌이 모습을 감추자 두려움은 더해 갔다. 영화농장 선녀들 중 가장 나이 어린 정님이 순녀의 손을 꼭 잡으며
"언니! 인자 우덜(우리들) 물에 빠져 죽겄네. 어쩌까이!"
하고 겁에 질린 얼굴이 되어 순녀를 쳐다본다. 순녀는 정님의 손을 꼭 붙들며
"정님아! 호랭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닥 했응께 정신 꽉 차리고 크게 소리 질러야!"
하고 정님의 등을 다독거려 준다.
"사람 살려! 사람 살려~~어!"
그때였다. 강 안쪽에서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발동선 한 척이 저 멀리 모습을 드러냈다.
"쩌그 배다. 배가 온다. 우덜 함꾼에(함께) 소리지르자!"
"사람 살려~어!"
영화농장 선녀들은 더욱 목청을 돋워 소리를 질러댔다. 그러나 발동선은 울부짖음에 가까운 이 들 영화농장 선녀들의 외침 소리를 들은 것인가 못 들은 것인가.
저 배마저 지나쳐 버린다면 꼼짝없이 죽을 판인데 배는 그저 가던 쪽으로 계속 가고 있을 뿐이고 물은 무릎까지 차올랐다.
"아그들아! 언능 소리질러!"
"요이 땅! 사람 살려~어! 사람 살려~~~어!"
영화농장 선녀들의 외침 소리는 발악에 가까워졌다. 그때 바람이 저쪽으로 불었던 것일까 아니면 천우신조인가 발동선의 뱃머리가 이쪽을 향한 것이다.
"배가 머리를 돌렸다. 배가 이쪽으로 와!"
"사람 살려~~~어!"
영화농장 선녀들은 두려움과 반가움이 뒤섞인 얼굴이 되어 배를 향해 손을 흔들었다. 이윽고 발동선이 도착했다. 발동선의 주인은 다름 아닌 양님의 친오빠인 대봉이었으며 강 아래쪽에 그물을 놓고 돌아오는 길에 위험에 처한 영화농장 선녀들을 우연히 발견하게 된 것이다. 영화농장 선녀들은 모두 배에 오르고 너나없이 기진하여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다,
“신동떡! 신동떡!”
목 놓아 신동댁을 부르며 사방을 둘러봐도 신동댁의 흔적은 없고 물결만 찰랑거릴 뿐, 아무런 일도 없었던 양 갈매기는 한가로이 허공을 날고 있었으니 영산강은 이날 또 하나의 슬프고 가슴 아픈 영화농장의 역사를 엮어 가고 있는 것이었다.


